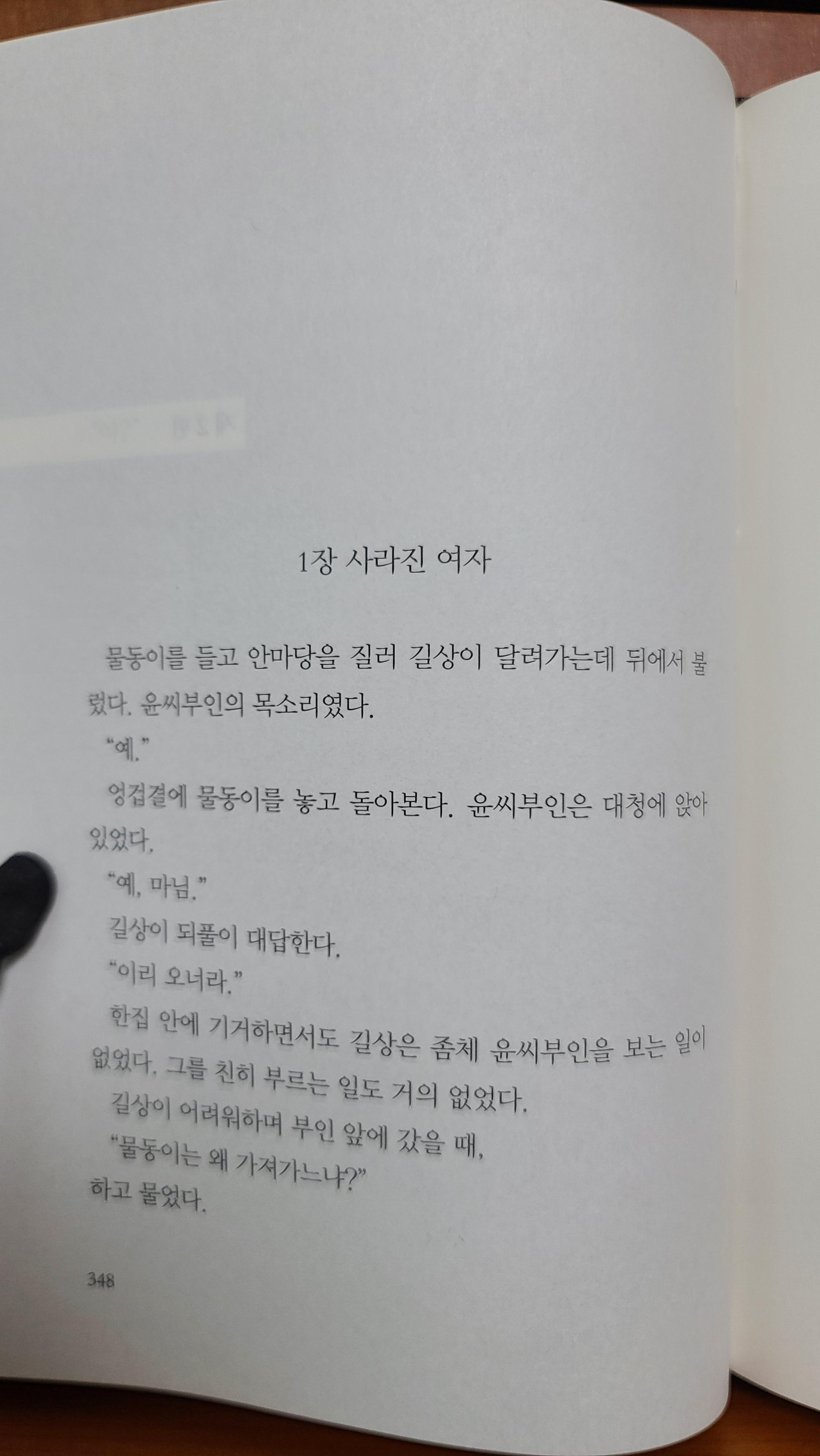토지 읽기 도전 16일차/ 박경리의 토지 1부 2권/ 4장 하늘과 숲이
나뭇잎에 찢겨진 조각난 하늘은 새파랗게 보였다.
깊은 골짜기 서늘한 곳으로 들어간 용이는 바위 아래 펑퍼짐한 자리에 가서 드러눕는다. 삽삽한 나뭇잎 썩은 내음이 물기를 머금고 콧가에 와닿았다.
(용이) ‘와 이리 심이 빠지노. 죽을 것만 같고나. ’
용이는 흙 속으로 자기 몸뚱어리가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았다. 어둠이 덮쳐 씌우듯이 내려왔다. 그 어둠 속으로 흐미한 아주 흐미한 빛이 한 줄기, 그것은 광명이기보다 슬픔과 원한의 파아란 빛줄기였다.
‘불쌍한 것!’
토지 1권 : 박경리 대하소설 | 박경리 저
*월선이를 떠나보낸 용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슬픔에 휩싸여 흙 속으로 자기 몸뚱어리가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용이
사랑하는 여인을 볼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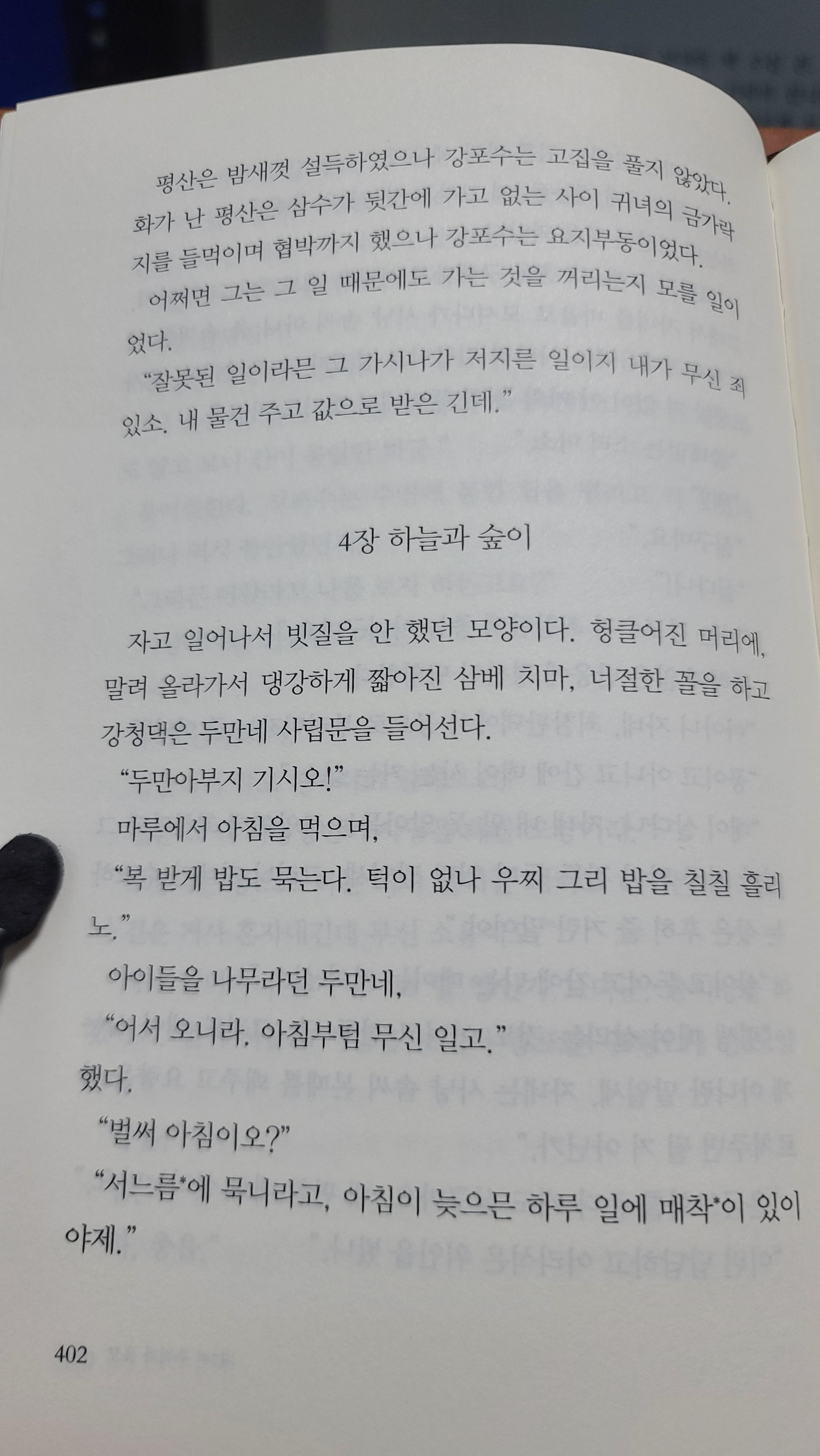
'[버킷리스트]죽기 전에 꼭 한 번 > [독서]박경리의 토지 읽기(20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토지 읽기 도전 18일차/ 박경리의 토지 1부 2편/ 6장 음양의 이치(강포수의 귀녀 사랑) (0) | 2022.08.11 |
|---|---|
| 토지 읽기 도전 17일차/ 박경리의 토지 1부 2편/ 5장 풋사랑 (0) | 2022.08.10 |
| 토지 읽기 도전 15일차/ 박경리의 토지 1부 2편/ 3장 실패(강포수 섭외 실패) (0) | 2022.08.08 |
| 토지 읽기 도전 14일차/ 박경리의 토지 1부 2편/ 2장 윤씨의 비밀(김개주) (0) | 2022.08.07 |
| 토지 읽기 도전 13일차/ 박경리의 토지 1부 2편/ 1장 사라진 여자(월선) (0) | 2022.08.06 |